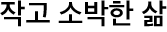2010. 12. 15. 01:56ㆍ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지난 이야기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아빠 얘기 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아빠에 대한 두가지 에피소드만 언급해보려고 한다.
첫번째
아빠는 내가 모자를 사오면 꼭 자기가 제일 먼저 써보려고 하신다.
내 생각엔, 새 신발을 사면 신발을 밟는 것처럼 약간 그런 주술적인 행위랑 비슷한 것 같다.
문제는 아빠가 털모자를 머리에만 쓰시질 않으신다는데 있다.
얼굴에도 써보시고 머리에 모자를 뒤집어 쓰신 채로 입 근처까지 털모자를 주욱 잡아당기곤 하신다.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래, 이래야 따듯하지!'라고 흡족해하신다.
그래서 아빠의 손을 거친 모자는 더 이상 모자가 아니다.
모자가 늘어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헐렁해져서 고개를 숙이면 모자가 스르륵 땅으로 떨어져버린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주머니가 되버리는 것 같다.
두 번째
아빠는 나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 특히 늦은 귀가를 하는 딸에게는 평소보다 더 큰 기대를 하시곤한다.
세상 어느 것 보다도 아주 절실하게 나를 기다리신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전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같다고 표현하신다.
아빠는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건 꼭 확인하고 주무신다.
물론 내가 안전하게 귀가한 것도 궁금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손에 들려 있는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시다.
만약 내 손이 텅텅 비어있다면, 아빠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나를 잠깐 바라보시곤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서 잠에 드시곤한다.
반대로 내 손에 먹을게 들려있다면 아빠는 딸을 키운 보람을 아주 온 몸으로 체험하시는 듯 하다.
그래, 이 맛에 딸내미를 키우지, 이런 심정인 것 같다.
아빠가 야밤에 야식을 앞에 두고 느끼는 환희는,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느낄 수 있을정도로 지대하다.
그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초호화판 로드퍼레이드와 불꽃놀이쑈를 보고 느꼈던 감정과 무척 비슷한 것 같다.
내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날이 잦아지자, 아예 이제 아빠는 내가 귀가할 때쯤 전화를 해서 구체적인 품목을 사오길 강력히 요구하신다. 가끔은 민망하신지, 엄마를 달달 볶아 나에게 전화를 해서 뭘 사오라고 말해달라고 주문하시기도 한다.
한 번은, 학원을 함께 다닌 오빠에게 필요한 인강과 책을 통채로 받은 일이 있었다.
고마운 마음에 다음 날 오빠에게 줄 도넛을 사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도넛을 보시곤 첫 눈을 본 5살 꼬마처럼 좋아하셨다.
"아이고 우리딸~뭘 이런걸 다~~진짜 오랜만에 도넛 먹게 생겼네~~"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셨다. 엄마가 아빠에게 오도방정 좀 떨지 않을 수 없냐며 짜증을 내실 정도였다.
아빠에게 사정을 말하고, 내일 도넛을 다시 사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또 세상에서 제일 슬픈 고양이같은 눈빛을 반짝 반짝 보내시면서 세상이 무너질듯이 허탈해하셨다.
재밌는 분이다.
항상 아빠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헛된 소망이란 것 쯤은 안다.
내가 아빠한테 뽀뽀하는 걸 아주 징그럽다고 생각하시지만 속마음은 좋아한다는 것 쯤 잘 알고 있다.
아직도 내 똥기저귀를 당신이 다 빠셨다는 말로 턱도 없는 협박도 하시고,
가끔 당신이 내 머리를 예쁘게 묶어준다 해놓으시고는 몇 번 머리를 빗어 묶긴 했는데 모양이 이상하니까 내 머릿결이 문제라며 나를 탓하지만 괜찮다. 새벽에 날 깨워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드리면 겨우 한다는 말씀이 물이 많네, 물은 반만 넣고 스프를 줄였어야지, 라면서 투덜대시는 건 고쳤으면 좋겠다.
내 수능 응원 선물로 들어온 간식을 나 몰래 거의 다 드시지만 아빠라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빠니까.
요새 집에서 너무 심심하다. 아빠가 어서 퇴근하셨으면 좋겠다.
(*이 글은 내가 막 스무살이 됐을 무렵 썼던 글이며,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해 14년 12월에 이 곳으로 글을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