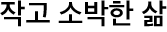daily letter(4)
-
창환선배
참다 못한 창환선배가 카톡을 하셨고 할 수 없이 연락을 받았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왈칵 올라왔다. 선배는 '이런 말 듣기 싫겠지만 그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안돼. 계속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뭐 나오는거 아니다. 너는 너를 챙겨야지, 너를 아껴야지.'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다. 힘을 내보려고 바득바득 노력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다. 눈물만 나고 삶의 의지는 저 깊은 곳으로 계속 푹 푹 꺾인다. '사는거 원래 고통이야. 이거 지나면 더 큰 고통이 오고, 또 더 큰 고통이와.' 맞는 말인데, 나는 점점 주눅들기만 한다. 나도 모르겠다.
2025.06.17 -
다시 차분해졌다.
꽃이 피면 벌은 저절로 온다. 그 말 앞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향기가 나면 자연히 벌이 올텐데, 나는 무엇이 그리 불안하고 두려워 그 사람에게 안달복달 했을까. 시간이 지나 냉정하게 곱씹을 수록 그의 형편 없음에 기가 막힐 따름인데. 꽃이 피면 된다. 가득 꽃 피우자. 힘을 내서 꽃대궁 밀어올려, 환한 꽃을 틔우자.
2025.06.16 -
일종의 폐인
폐인처럼 작은 방에서 생활한지 여러 달이 지나고 있다. 몸과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어 굴 속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곰처럼, 나는 내 작은 공간 안에서 가만히 웅크린 채 지내고 있다. 오죽하면,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지만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무더워졌는지, 비가 오는지, 화창한지 따위의 것들 조차 알지 못할 정도다. 옷장에는 두터운 털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다. 사람들의 연락은 모두 받지 않는다. 걱정할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터지거나 혹은 내가 그들을 걱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계속 피하고 있다. 부모님께는 서른 중반을 넘어선 딸이 폐인처럼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책상 앞에만 우두커니 앉아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2025.06.13 -
2025년 나에게 쓰는 편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