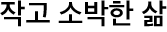아무 사이 아닌데
2018. 1. 16. 15:15ㆍ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지난 이야기
몇 주 째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일하는 요즘.
병원에 가서 약 받아 와야 하는데, 왠지 오늘도 병원은 물 건너 가버린 것 같다.
점심시간에 그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밥은 먹었는지, 병원은 갔다 왔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밥도 못 먹었고 병원도 못 갔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 허탈하게 웃었더니
그 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곧 갈테니 병원 같이 갔다가 뭐 좀 먹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화를 버럭.. 도대체 네 몸 보다 더 중한게 뭐냐며..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닌데, 그리고 난 쌀쌀맞기만 한데,
왜 그 분은 내게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미안하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일 많아서 줄창 사무실에서 밤을 샜을 땐, 자기 집에서 데스크탑을 떼와서 내 일을 돕겠다고 나서질 않나.
밥 못 먹고 일하는건 어떻게 그리 귀신같이 알고, 낮이고 새벽이고 한 달음에 달려와 뭐라도 억지로 먹이질 않나.
너야말로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끔찍히 챙기는데.
쌀쌀맞아도 좋으니, 자기에게 아주 작은 여지라도 남겨주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과분한 마음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니. 도대체 어찌해야 해.
'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 > 지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 사람이 아니다 (0) | 2018.03.21 |
|---|---|
| 사업 시작한지 5개월, 그간 배운 것. (0) | 2018.01.19 |
| 얕은 물 (0) | 2018.01.03 |
| 요 근래 주고 받은 선물들 (0) | 2017.09.30 |
| 인생 생과일 주스 (0) |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