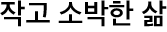2022. 5. 25. 00:52ㆍ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지난 이야기
이 글은 정말 아무말 대잔치로 적은 것이다.
1. 종로에서 빈대떡과 육회를 포장해 온 날
이번 주 서울을 다녀오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종로에서 엄마의 갱년기 약과 광장시장의 음식을 포장해 온 것.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육회와 빈대떡 반죽을 포장해(드라이아이스 팩을 여러겹 덧대서) 내려온 것을 본 엄마는기함을 했지만, 다행히 음식은 멀쩡했고,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타지의 유명한 음식점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이 나의 루틴 아닌 루틴이니) 식구들에게는 이 상황이 익숙하고 의미부여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가족과 맛있는걸 같이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울서부터 근 1.5kg 가까운 음식을 드라이아이스로 밀봉해 갖고 내려온 것이었고, 심지어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좀 더 기특했다. '역시 사랑이란건 받는게 아니라 주는 것이던가..'라고 혼자 자기만족도 하고...;; 하지만 무모한 짓이긴 했다. 더운 날에 음식 포장해 내려오는 건 건강 생각해서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2. 엄마
날이 덥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사나운 눈으로 옆의 사람을 쏘아 보고 퉁명스럽게 구는 엄마에 대해 어떤 측은지심이나 연민도 들지 않는다. 그저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 뿐.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기분이 괜찮아 졌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라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3. 클렌징
클렌징을 연습하기로 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안되는 범위의 일은 과감히 덮는 것. 그리고 몸을 쓰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건조한 몸에 보습제를 바른 뒤에는 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
4. 죽음을 상상하며 보낸 일주일
지난 주 화두는 '죽음'이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그것을 고민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잘 살고 싶어서' 죽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유투브 알고리즘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의 이야기을 계속 추천해 주었다. 나 역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 '나에게 오늘 하루만(혹은 일주일만) 허락된다면' 같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됐다.
예전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가족들이나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엔 '통장 정리'(...)를 제일 먼저 해야한다는 생각부터 했다. (20대와 30대의 차이란...) 내 명의로 된 계좌를 탈탈 털어보고(...) 각각의 은행에 얼마가 예치돼 있는지를 리스트업해서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처리를 해두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빚이 없어 다행이라 여겼다. 빚이 있어으면 가족들에게 미안했을 것이고 내 성격 상 떠나면서도 맘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리곤 동생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 내가 자주 쓰는 ID와 비밀번호,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그 밖에 온갖 정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 등을 정리했다.
그 뒤로 물건 정리를 했다. 유품 정리가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물건만 남기고는 모두 처분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내가 가진 물건이 생각보다 아주 없다는 것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 옷 몇 벌(아크릴 정리박스로 3박스 나왔다. 패딩, 수영복 등등 옷이란 옷은 모두 포함해서...)과 핸드백 두 개, 이불 한 채
- 아빠에게 선물 받은 얇은 손목시계 2개, 혹시 필요할 때 없을까봐 사다놓은 미용용품 몇 개(렌즈 클리너나 선크림, 머리끈 같은 것), 악세사리 아주 조금(만원짜리 귀걸이 하나, 5천원 주고 산 싸구려 브라스 실반지, 직장인이던 시절 내돈내산한 큐빅 목걸이 하나.)
- 평소 신는 신발 5켤레(운동화, 구두, 겨울털부츠, 샌들, 등산화 1개씩)와 새 신발 두 켤레(아빠가 선물해준 샌들과 오랫동안 고민하다 구입한 장화)
- 가전제품(선풍기 1개, 드라이기, 고데기, 다리미, 스탠드), 자취할 때 쓰던 그릇과 도마, 발매트, 요가매트, 2kg 덤벨 하나, 등산가방
- 노트북, 카메라, 드론 등 촬영장비(업체 대표인데도 갖고 있는 장비는 엄청 간소한 편)와 계산기, OTP, 도장, 통장, 여권
- 꽤 많은 책. 그리고 노트 몇 권, 필기도구 몇 개(노란색 만년필, 원목 책갈피, 형광펜 몇 자루, 휴대용 연필깎기 등)
- 몇 장의 편지(살면서 받은 대부분의 편지는 이미 모두 버렸다)와 10대 시절 학교 과제로 만든 만든 자서전과 사진 몇 장
- 동금언니가 선물해준 내 초상화(일러스트레이션), 조립해서 세워놓는 키티 장식품, 손 때 묻은 노란 리본, 친구들이 여행지에서 사다 준 엽서 몇 장과 작은 기념품 몇 개
- 항생제 한 뭉텅이
갖고 있는 물건도 얼마 없는데 게으름을 피운 탓에 물건 정리 하는데 꼬박 3일이 걸렸다.
그 다음엔 유서를 쓰려고 종이를 펼쳤는데 막상 쓸 말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면서 아쉬웠던 몇 가지 순간과 선택에 대해 적었고,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해 적었고,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적었고, 가족들에게 '30대 들어 행복한 순간이 많았고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겼으며 삶에 미련이 없다'는 내용과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내용의 편지를 서너 줄 적었다. 그렇게 적은 유서가 a4용지 한 장을 꽉 채웠을 땐 '아직 내 통장과 인감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내가 남몰래 쓰던 블로그가 있는데 삭제해 달라는 내용 같은 것들은 적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부탁까지 전부 적으면 얼마나 유서 분량이 늘어나야 하는거야? 몇 줄 짜리 심플한 유서를 적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해야할 일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잘 하려면 쉬운게 없군 ㅠ '라고 생각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욕망이 떠오르거나 희미한 무언가가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재밌고 명랑하게 살고, 생활이든 일이든 분석이든 원고 작업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이다. 그러다보면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의 욕망과!
이렇게 글을 급 정리하는 이유는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를 해먹기 위해서. 우선 오늘은 야식으로 계란 후라이에 밥을 조금 먹고, 내일 아침은 아주 근사한 구운 샐러드를 먹어야지.
'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 > 지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황 (0) | 2022.05.22 |
|---|---|
|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틀어지고 (0) | 2022.05.12 |
| 부치지 못한 편지 (0) | 2022.05.08 |
| 멍청하지! (0) | 2022.05.03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0) | 2022.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