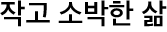2011. 1. 1. 20:28ㆍessence, existence/1월 1일
'쌤~!! 저 민지잖아요!><'라고
애써 쿨한 척 환한 척 웃으면서 졸업한지 일 년이다.
20살이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의연해질 것이라 상상했었다.
그러나 나는 2010년 한해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약하고 무기력했고, 별 볼일 없었다.
단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 전부 같았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소중한 것을 위해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던 굴욕적인 순간도 있었다.
자신이 없었고, 내가 잘해낼 거라는 막연하게나마 남아있던 믿음과 확신은 흔들렸다.
치열하지 않았고, 낭만적이지도 않았다.
의도적으로 가능한 많은 것과 단절하고, 헤어졌다.
만나는 것만큼이나 헤어지는 것도 쿨하고 간지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싶었지만
역시나 관성적으로 아파하고, 헤어나오지못하고, 저주했다.
속물이 될까봐 너무 무서웠고, 책은 거의 읽지 않아서 머리는 완전 깡통이 됬다.
예상치 못한 계기로 가까워진 사람이 있고 아주 신기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질려버렸다.
재수학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다른사람들에게 의지해보는 낯선 경험을 했다.
열 두달 중에 한 달 넘게 입원해있었고, 교통사고가 많았고, 죽음의 순간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빌고 또 빌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솔직하지 못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무척 침착하고 평온한 척 했지만,
내 마음은 진정되는 날이 없었고 항상 복잡했고
엄청난 해일로 아수라장이 된 해변 시가지 같았다.
손을 꼭 잡고 싶던 순간이 있었는데, 애써 이어폰을 끼고 양손은 깍지를 낀 채로 힘을 줬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잠에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입에서 피맛이 계속 났다.
제 때,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엉켜버리기만하는 타이밍.
언니네 이발관에 꽃혔고,
아름다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게 그나마 내가 상상해온 스무살적인 낭만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인 척하는 병은 쪼글쪼글 할머니가 되어 눈 감는 날까지도 못 고칠 것 같다.
기타를 배우고 싶고, 일 분 일 초도 버리고 싶지 않다.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책도 많이 읽을거다.
더 친절하고 많이 웃고 따듯한 사람이 되고 싶고, 버킷리스트도 많이 지우고 싶다.
21살은 20살보다는
더 절박하게 살고 덜 허무하고 싶다.
2011/01/01
'essence, existence > 1월 1일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5년을 보내며 (0) | 2016.11.25 |
|---|---|
| 2014년을 보내며(2) (0) | 2015.01.21 |
| 2014년을 보내며(1) (0) | 2014.12.10 |
| 2013년을 보내며 (0) | 2014.01.01 |
| 2011년을 보내며 (0) | 201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