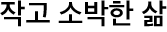방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부리나케 달려와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꿈을 꿨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이었고, 나는 환승하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지하철이 도착했고 지하철에 탔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황급히 플랫폼을 바라보니 창식이가 웃으면서 서있었다. 그 순간, 지하철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해버렸다.
꿈 속에서 창식이가 나왔는데도 뭔가 그렇게 꿀꿀하지는 않은 아침이었다.
아침밥 대신 빵 한조각 먹고
머리는 대충 묶고 티셔츠 한 장, 봄 가디건, 짧은 면 스커트를 입고 통순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목도리를 하기에는 이미 3월이 너무 가까워져와있었다. 그래서 파란색 스카프를 둘렀다.
그냥 춥고 싶어서 춥게 입고 나간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마당에 있는 돌난간에 앉아서 기타를 쳤다.
오늘따라 통순이가 병에 걸린 환자같은 소리를 냈다.
평소처럼 맑은 소리가 안났는데, 나는 그래서 더 줄을 세게 뜯었다.
한참을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오셨다.
엄마가 내 이름을 너무 크게 부르시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서 들어갔다.
엄마는 쫒겨난 애마냥 왜 옷도 얇게 입고 그러냐고 핀잔을 주셨다.
내가 엄마에게 요새 부쩍 창식이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꿈 얘기도 해드렸다.
엄마는 내 얘기를 흥미롭게 들으셨다. 그리곤 알았다,고만 하셨다.
그 순간 우연히 엄마와 얼마전에 꿈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엄마는 작은 외삼촌의 49일재를 전후해서 꿈을 참 많이 꾸셨는데, 떠나가는 삼촌의 뒷모습을 많이 보셨다고 한다.
나는 엄마의 꿈과 내가 꾼 꿈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꿈 속에서 창식이 표정이 어땠냐고 물어보셨다.
꿈 속에서 창식이는 조금 슬프게 웃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미묘한 부분들까지 엄마에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냥, 창식이는 웃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엄마가 창식이 49일재는 안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생각없이, 아직 한 달도 안됬잖아,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방에 뛰어 들어가서 달력을 놓고 다시 날짜를 계산했다.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이 딱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손에 힘이 픽 풀려서 달력을 놓쳤다.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아냈다.
창식이가 호흡기를 떼기 직전에 남겨둔 음성 메세지를 계속 들었다.
오늘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상에 떠돌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날이다.
엄마는 창식이가 날 무척 많이 좋아했나보다고 말해주셨다.
괜히 그런말을 들으면 슬퍼서 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이 딱 멈췄다.
창식이의 호흡기 떼고 의사가 처음 내뱉은 말이 '독한놈'이라는 단어였다고 한다.
의사 말이 맞다. 창식이는 독한놈이다. 참으로 징글맞을 정도로 독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창식'식으로 작별인사를 하는 녀석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정말 우리는 참으로 징그럽고도 대단한 우정이었다.
그리고 엄마 말 대로 창식이가 꿈 속에서 웃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다.
'창식이와 아이들' 첫 공연에서 나는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는 벌써 옛날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작년 이맘때
아프니까 청춘이라,던 애 늙은이같기만 한 김창식의 개똥철학을 들으면서 야유를 보내고 소맥 10병을 거뜬히 비워내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마지막이다. 그리고 첫 시작만큼이나 끝도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죽기 전에, 꼭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든 영화로든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게 꼭 세상에 남겨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