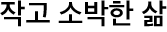2022. 7. 23. 00:39ㆍ당분간 머무를 이야기
1. 생애 가장 길었던 머리를 잘랐다. 등 뒤로 치렁치렁 늘어지던 긴 머리, 그러나 곱지 않은, 상하고 부시시한 머리들이 가위질 몇 번에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아쉬웠지만 속시원했다. 머리는 훨씬 가벼워졌고 산뜻해졌다.
2. 지저분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잘라내고 정리하며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방 청소가 그렇고 일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다. 엉뚱한 관계들이 내 삶을 휘감고 들어오려고 하는 요즘, 크게 주저하지 않고 가위를 들었다. 어떤 이는 그런 나에게 이해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아마도 나의 '틀'이 너무 완고하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단정하고 정갈한 삶과, 생활이 중요하고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제는 충분히 예의 있고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을 내 삶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거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3. 일 년에 한 두 번 연락해서 안부 묻고 밥 한끼 정도 하던 지인이 연말에 에베레스트를 다녀온다고 한다. 도화선에 불이 붙듯, 그 말 한 마디에 나도 모르게 십 몇 년 전에 접었던 어떤 기억에 불이 확 붙었다. "혹시 나도 일정이 맞으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래. 나야 가이드 비용 나눠서 내면 좋지." 내년 봄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에베레스트도 다녀올 수 있을까? 그렇게 두 곳을 다녀오고 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길까? 무력한 마음에 용기가 조금 들어설까?
4. 어제는 진이에게 저녁을 사주기 위해 오랜만에 사무실을 나섰다. 내가 진실로 아끼는 몇 안되는 사람, 여동생, 후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식어는 친구. 진이에게 들은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 애의 친구들이 진이에게 했다는 말이었다. "진아, 우리가 고른 음식점이 입맛에 맞고 마음에 든다니 너무 기뻐. 어떻게 하면 네가 서울에서 가장 행복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골랐거든." 진이는 이 마음이야 말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행복한 너를 보며 나도 행복해지는 것. 나 역시도 정말 동의했다. 나도 진이도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5. 엄마에게는 여전히 까칠하다. 나란 인간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지만, 엄마에 대한 이해는 영 깊어지지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록 엄마를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엄마에게 거칠게 말하고 투박하게 대한다. 마치 당신이 30여년간 쌓은 업보를 이렇게라도 청산하라는 듯이. 그런 나의 마음도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6. 나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동시에 반대급부로 그들과 심리적 거리감도 유발한다. 나란 인간에 대한 평가가 냉정할수록 타인에 대한 평가 역시 냉정하게 이뤄진다.
인간에 대해 따듯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생각한다.
7. 지식 콜렉터들에 대한 지루함과 경멸이 점점 심해진다. 나 역시 오랫동안 이런 부류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고까운 마음은 나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 지점이 분명히 있다.
20대의 나는 삶의 진실은 책에 있다고 믿었지만 30대의 나는 그 때의 믿음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삶의 진실은 삶 한가운데 있다. 삶이란 강물에 발 담그기는 두려워 하며 멀찌감치 떨어져 나무그늘에서 옛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강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의 말이란 얼마나 힘이 없는가. (누구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삶을 관념적으로 대하는 습관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온갖 더러운 구정물에 발 담궈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8. 가슴이 콱 막힌 듯한 답답함이 지속됐다. 정확한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왜 그런 기분이 되었는지 생각할 마음 조차 들지 않았다. 엄마의 거지근성에 화가 났을까, 잘 안풀리는 일 때문에 답답했을까, 좁고 우울하기 그지 없는 공간 때문에 그랬을까, 쉴 틈 없이 일과 일과 일로 이어지는 생활에 진저리가 났을까. 여러 짐작이 들었으나 깊게 생각하는건 어려웠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꿎은 책상 배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책들도 한쪽으로 몰았다. 책이 가득한 벽면이 벽돌로 공고하게 쌓아올린 완고하고 답답한 벽처럼 느껴졌다.
9.
"서로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헤어진 뒤에는 그 친구를 마음 속에서 잘 떠나보내기 전에 덜컥 다른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맘 먹었고 그렇게 마음이 정리되기 까지 삼 년 반이 걸렸어요. 그 때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후회요? 전혀요. 전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랑했던 시간 만큼이나 사랑했던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시간 역시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처럼 느껴져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살면서 정말 사랑 같은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다면, 태어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분간 머무를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리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0) | 2022.08.02 |
|---|---|
| 괜찮은 사람. (0) | 2022.07.30 |
| 근황. (0) | 2022.07.19 |
| 근황. (0) | 2022.07.09 |
| 오랜만에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