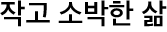화분
2015. 4. 30. 08:13ㆍ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지난 이야기
꽃시장 구경하고 화분 사들이는건 좋아하지만 정작 잘 기르지는 못하는 탓에 내 손만 탔다하면 식물들은 족족 죽어갔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식물을 기르는 일은 엄두도 내지 않게 됐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지난 늦가을 쯤 작은 화분을 하나 들이게 됐다. 그러다 이번 봄, 겨우내내 내 방 책상 위에서 햇살 한 번 제대로 못받은 녀석이 안쓰러워 날이 풀리자마자 마당으로 거주지를 옮겨줬는데 며칠이 지나니 예쁜 초록색 잎은 검게 변해 줄기만 남긴채 후두둑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아마 화분이 얼었던 탓이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평소같으면 어떻게 손 쓸지도 몰라서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을텐데 이번엔 어떻게든 살려봐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생겨 이주일 가량 품에 끼고 돌보고 있다. 정말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며칠 전부터 새 잎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 줄기만 남아 휑했던 화분에서 돋아난 아주 작고 싱그러운 잎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먹먹해지게 된다. 또 생명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해서 화분에 입김 닿는 것과 손 끝이 스치는 것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됐다. 생명에 정이 드는 것은 이런 것인가보다.
작은 화분에서 귀한 가치들을 배우고 있는 4월, 워낙 잔인한 달이라 더 그 의미가 마음 찡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관찰과 기록, 성찰과 결행 > 지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쇠고기 찹쌀구이와 부추 샐러드 (0) | 2015.05.09 |
|---|---|
| Rimrock 안경 (0) | 2015.05.09 |
| 고요한 4월의 새벽 (0) | 2015.04.27 |
| 세월호 1주기 (0) | 2015.04.16 |
| 결국 마지막이라는 말 대신 당분간이라는 말을 선택했다. (0) | 201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