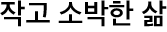2018. 10. 6. 20:45ㆍessence, existence/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
어느 날 한 밤 중의 식사에 대하여
22:30
못 먹고 못 자고, 오로지 일과 일과 일만 생각하며 보낸 시간들이 일단락됐다.
최종결과물을 첨부한 메일을 전송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와락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나는 몇 주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이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숨 돌릴 새도 없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프로젝트들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 '우선 밥부터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회신을 해야 하는 메일들을 살펴보고 있는 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3:30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힘들다'고 펑펑 울었다. 엄마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몸 상해가면서 돈 버는건 아니라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며칠 내내 밥을 못먹었으니 속이 비어있는 상태라 더 공허하게 느껴졌을거라고 한참을 달래주었다. 엄마의 말에 곧 진정이 된 나는 전화를 끊고 찹쌀을 가득 씻어 찰밥을 했다. 밥을 앉히고 나니 그간 손대지 못해 한껏 어지럽혀진 부엌, 유통기한을 한참 넘겨버린 음식들이 눈에 들어 왔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주섬 주섬 치워나갔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챙기지도 못한 채 정신 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을 목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렸는데, 그 와중에 칙칙 증기를 뿜어내면서 열심히 밥을 짓는 밥통을 보며 작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먹을 밥을 열심히 짓고 있는 녀석의 '열일'이 고마웠다. 물론 녀석은 그저 명령어 대로 일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24:00
밥이 다 됐을 무렵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에 육개장이 맛있게 됐어. 남은 육개장 들고 왔으니 잠깐 나와 받아가렴." 정신없이 내려가니 엄마가 육개장과 새로 썰은 김치, 그리고 밥통에 있던 밥을 싹싹 긇어 눌러 담아서 오셨다.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틀을 내리 굶으면 어쩌냐는 말과 함께 안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가 등을 토닥여줬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금방 진정됐다. 집에 올라와 육개장을 끓여 국공기에 담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밥을 먹는데 정말 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 며칠 만에 구경한 밥이, 집 반찬이,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자정 무렵 갖다주신 육개장이 그 무엇보다 따듯한 선물이었다. 아주 오랜시간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심야식당을 보는지, 카모메 식당에 앉아 일상적인 음식을 먹으며 담백하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 앞으로는 공허한 마음 속에 뜨거운 것을 밀어 넣고 소주를 털어넣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냥 가벼워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공허한 마음 속으로 밀어넣는 뜨거운 것에게 고마울 것도 같다.
'essence, existence >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는 공간에 대하여 (0) | 2019.01.23 |
|---|---|
| 아버지 생신상 준비 (0) | 2019.01.18 |
| 대전 '2018 빛깔 있는 축제'를 다녀오다. (0) | 2018.08.18 |
| 다시, 지리산 종주. (1) | 2018.07.31 |
| 엄마와 세 번째 데이트 (0) | 2018.01.21 |